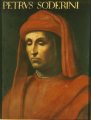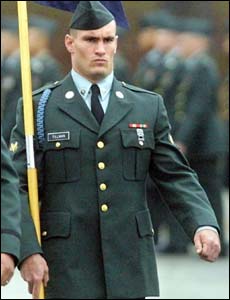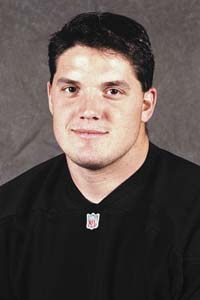곽재구
-김치찌개 평화론-
김치찌개 하나 둘러앉아
저녁 식사를 하는 식구들의 모습 속에는
하루의 피곤과 침침한 불빛을 넘어서는
어떤 보이지 않는 힘 같은 것이 들어있다.
실한 비계 한 점 아들의 숟가락에 올려 주며
야근 준비는 다 되었니 어머니가 묻고
아버지가 고추잎을 닮은 딸 아이에게
오늘 학교에서 뭘 배웠지 그렇게 얘기할 때
이 따뜻하고 푹신한 서정의 힘 앞에서
어둠은 우리들의 마음과 함께 흔들린다.
이 소박한 한국의 저녁 시간이 우리는 좋다
거기에는 부패와 좌절과
거짓 화해와 광란하는 십자가와
덥석몰이를 당한 이웃의 신음도 없다
38선도 DMZ도 사령관도 친일파도
염병헐, 시래기 한 가닥만 못한
이데올로기의 끝없는 포성도 없다
식탁 위에 시든 김치 고추무릅 동치미 대접
하나
식구들은 눈과 가슴으로 오래 이야기하고
그러한 밤 십자가에 매달린
한 유대 사내의 웃는 얼굴이 점점 커지면서
끝내는 식구들의 웃는 얼굴과 겹쳐졌다.
*곽재구 시집 '전장포 아리랑' 중에서.
*20대 초반,
이념과 종교 문제로 고민하며
허우적거리고 있을 때,
살며시 다가와
나를 다독거려준 시.
지금은 나도 가장이 되어
고추잎 닮은 딸을 바라보며
그 시절 미망들을 떠올리다
웃음짓곤 한다.
'좋은 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김규동, 거지 시인 온다 (0) | 2018.10.22 |
|---|---|
| 野雪 (1) | 2013.02.19 |
| 두 번은 없다 (0) | 2012.12.31 |